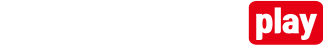◇ 배고픔을 덜어주려는 것보다 배아픔을 노리는 것 아닌가
선택적 일부 진실로 전체적 보편 논리의 방향이 의도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 나는 프로파간다(propaganda) 같은 용어는 쓰기 싫다. 그러나 왠지 우리사회엔 어느 시점부터 알게 모르게 “배고픔 해결”이 아닌 “배아픔 자극”을 추구하는 자들의 주장이 난무하게 되었고,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1억원 벌고 8등 되는 것보다 2천만원 벌더라도 2등 되는 것이 기분이 더 좋은 쪽으로 경도되면서, 가난이 벼슬이요 감투인 사회를 만들게 되었다. 자신이 더 잘 살려고 하는 노력보다 남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야 하는 모순에 중독되어 간다.
일례로 얼마 전에 지급해준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난 생활비를 그만큼 저축했다. 앞으로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할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헌데, 알고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으로 생계문제 해결이 아닌 오락이나 유흥에 사용한 예가 많았다는 말을 들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땐 좋아하긴 해도 고마워하진 않더라는 거다. 배고픔을 치료한다는 분배논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배고픔 문제를 해결한 건 성장주의 시대였지 분배주의 시대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어온 분배논리는 입으로는 배고픔의 해결을 빙자하여 속으로는 배아픔을 유도한 건 아닐까?
게으르고 낭비해서 가난해도 피둥피둥 살찌는 세상이니, 분배논리가 씨알이 먹혀들려면 배고픔보다 배아픔을 자극해야 분기탱천이 유도되는 것 아닐까?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분배가 배고픔 문제인 줄 알았던 것 아닐까? 배고픔 해결에는 분발(奮發)이 필요하지만 배아픔 유도에는 분노(憤怒)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
◇ 부자가 만든 공산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상인이 분배를 하지만, 사회주의에서는 통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분배를 한다. 그래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기업가가 부자이지만,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공무원이 부자인 것이다. 러시아의 ‘올리가르히(oligarch)’라는 신흥부자들이 대부분 구소련의 공무원이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대부분의 공산주의 혁명가라는 사람들은 부자였다는 것이며, 또한 거짓말쟁이였다는 것이다. 칼 마르크스부터 부잣집 유태인 집안 출신인데, 당시 영국사회 평균소득의 3배나 벌고도 방탕하게 가정을 살피지 않아 아들이 죽자 관을 못 만들어줬는데, 그는 이를 두고 자본주의의 모순에 따른 가난 때문이라고 말을 돌렸다. 피델 카스트로나 체 게바라도 변호사나 의사 출신으로서 가난과 거리가 멀었다. 육체노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빈민구제(배고픔 해결)를 한 게 아니라 가난을 남(부자/미국 등)의 탓으로 인식시켜 빈자의 분노를 유도하려는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렇게 분노가 유도된 빈자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지 결코 똑 같은 빈자가 되지 않았다. 그 지도자란 건, 장차 부자의 것을 뺐어 빈자에게 줄 부(富)의 통제권을 쥐겠다는 것이고, 그 통제권은 권력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겐 배고픔(절대적 빈곤)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스스로 세뇌하지만 실제로는 배아픔(상대적 박탈감)이 유도되어 생겨난 군중심리에 젖어든 데 불과하다. 배아픔을 구슬려주는 자가 구세주처럼 느껴져 아주 씨알이 잘 먹힌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지 극렬 사회주의자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출신이 거의 없다. 또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듯 가난에서 탈출해 자수성가를 이룬 사람치고 사회주의자는 거의 없다.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은 가난을 현실이 아닌 낭만으로 누리면서 빈자 코스프레를 잘 하는 부자 출신이었고, 스스로의 부정적 의식에 따른 비도덕성을 지적우월에서 우러난 반사회성으로 포장한 형태가 대부분이었다고 본다.
참고로 필자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지 않는다. 초록이 동색이기 때문이다.
다만, ‘강자의 관용과 권력의 통제가 없는 평등은 불가능하다’고 믿으면서 배아픔 때문에 그러한 평등에 유도되어 지지하는 자들은 영혼이 없다고 본다. ‘자유는 개체적 자아(個體的 自我)를 존중’하는데 가치를 추구하지만, ‘평등은 군체적 자아(群體的 自我)로 결속’시키는데 목적을 추구한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의 조직 명칭에 ‘세포’(細胞.Cell)라는 용어가 많은지도 모르겠다. 평등은 인간을 단세포화 시킨다는 뜻인가?
◇ 평등이라는 새로운 오만
원래 평등은 강자의 넘쳐나는 자유 때문에 그늘 지워진 약자의 피우지 못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이젠 약자보호라는 것이 아예 약자숭배로 변질되어가면서 전통적 약자가 새로운 감투로 등장하고 있다. 처음에 공짜로 줄 땐 적선이지만, 그 다음부턴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듯 약자에 대한 관용적 배려가 점점 숙명적 굴종으로 변질되고, 이제는 일해서 버는 것보다 놀면서 받아먹는 게 더 커질 정도로 부당한 지경에 이르렀다.
약하지 않은 자도 약자 코스프레를 해야 하고, 가난하지 않은 자도 빈자 코스프레를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서 생긴 걸까? 필자 생각엔 보통선거 때문이라고 본다.
원래 선거는 납세자 투표다. 동양권에 선거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도 초기에는 연간 적정금액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게 보통선거가 되면서 사회적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1인1표의 선거권이 주어지다보니, 먼저 얘기한 평균소득 이하의 사람이 80%가 넘는 점에 착안한다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오로지 복지수혜만 받고 사는 사람들이 선거유세에 있어 주효한 공략대상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나랏돈은 눈먼 돈이니 안심 놓고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다보니, 그게 누적되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여 강자의 관용이던 평등이 약자의 오만으로 변해버린 것 같다.

나보다 더 좋은 차 몰고, 나보다 더 큰 TV를 보고, 나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힘들게 세금까지 내가면서 언제까지 동정해주어야 할까? 그러고도 그들의 마르지 않는 샘인 납세자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풍겨오는 배아픔, 과연 그런 납세자들이 이 땅을 떠나 더 이상 뜯겨줄 사람이 없는 상황을 생각이라도 할까?
어릴 때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미래 목표로 삼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실의 가난은 달게 받아들인 거지 과거에 원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가난이 벼슬이 되다니? 생각해볼 일이다.